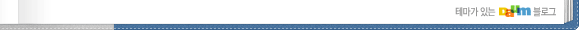[스크랩]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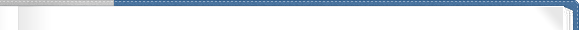

이렇게 찬바람이 뼈 속 깊숙이 파고들 12월이 찾아오면, 낮은 기온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 엄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며칠 후면, 엄마가 돌아가신 기일이 다가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면, 아직 어린 녀석들이 속이라도 섞일 때면 어김없이 당신은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막내를 낳으시면서 임신중독증까지 앓고 제대로 몸도 추스리시지도 못하고, 육남매 오직 공부시키겠다는 일념하나로 소 장사를 나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논일, 밭일 혼자서 다 해내신 의지력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학교라는 문턱을 넘어보시지 못하였기에 자식들 공부만은 시켜야겠다고 하시며 동네사람들에게 ‘저 미친 사람들’이란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묵묵히 그 세월 보내셨기에, 지금 우리 육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 놓은 것 정리도 잘하시는 부지런하신 분, 고장 낸 물건들 "손에 몽둥이를 달았나?"하시며 뚝딱 고쳐내시는 손재주를 가지신 분, 어깨너머로 배운 한글, 머리 회전 잘 아셔서 기억력도 좋으시고, 어려운 일에도 슬기와 지혜로 이겨내시는, 누구에가나 엄마란 존재는 그렇겠지만 특히 내겐 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엄마!
이 막내, 들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 개구리처럼 방바닥에 엎드려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어 나오지 않는 젖 먹이지도 못하고 보리미음과 밥을 씹어서 저를 키우셨다고 시집을 간 후, 큰오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시집 안 가겠다고 버티는 막내를 보고 애도 많이 태웠을 것입니다. 동료선생님의 소개로 맞선을 보고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그 환한 미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보시고, 너무 좋아라 하시며 이 막내 집에 오셔서 사돈과 함께 두 녀석들 돌 봐 주시던 할머니들의 손길 있었기에 또한 편안히 직장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몸이라 우리 집에서 지내실 때입니다. 우연히 퇴근길에 떡집 앞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밥’이 눈에 띄어 하나 사 들고 갔더니 “아이쿠! 내가 약밥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하시며 맛있게 잡수시는 것을 보고, 난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주며 키워주었지만, 정작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모르고 자라왔으니 말입니다. 먹거리 많지 않은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 보다, 자식들 입에 넣어 주는 걸 더 행복하다 여기신 분이었으니....
그리고 온 가족이 엄마의 그 아픔이 ‘간암’말기라는 사실을 다 알아도 나만 몰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기에, 병원 달려가기 가까울 것 같아 우리 집에 모셔왔는데 마음약한 내가 엄마의 병을 알고 나면 정신 차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게만은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진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알아차린 못난 막내였습니다.
입이 까칠하여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시기인데도 죽거리를 준비해 놓지도 않고 출근 해 버려 남편에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픈 엄마 끼니도 안 챙긴다며....
몇 달을 함께 하면서 그저 난 당신에겐 철없는 막내일뿐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려면 방학 때 편히 하세요!”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나?”
“그래야 오빠들이 편안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뒤뜰에 있는 논은 큰오빠 종답이고, 앞뜰에 있는 논은 셋째오빠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조카들 몫이고, 편안하게 주고받던 대화들이 유언인줄도 몰랐습니다. 겨울방학을 하고 오빠들이 엄마를 시골로 모셔가고 난 뒤,
“막내야, 엄마가 미음을 하나도 안 먹는다. 네가 와서 좀 먹여봐라”
“그래요?”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조용히 입 꾹 다물고 누워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목청껏 불러 보았습니다.
막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꼼짝도 않으셨다던 실눈을 살며시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게 엄마와 내가 나누었던 마지막 눈 맞춤이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쏟았던 그 정성 반도 채우기 전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그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 다 쏟아 부었을 텐데……. 원망스럽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난 며칠 후면, 엄마가 좋아하는 약밥을 사 들고 갈 것입니다.
엄마!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편안히 잘 지내신거죠?
오늘도 보고픈 마음에 잔뜩 찌푸힌 하늘을 보며 난 나즈막히 불러 봅니다.
"엄마!~~"
괜스레 이슈트랙백을 보고 '부모님께 편지 보내기'가 눈에 들어와 엄마에 대한 후회스러움을 몇자 적어 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 하세요.
그저 물질적인 것 보다, 마음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게 진정한 효임을 ....